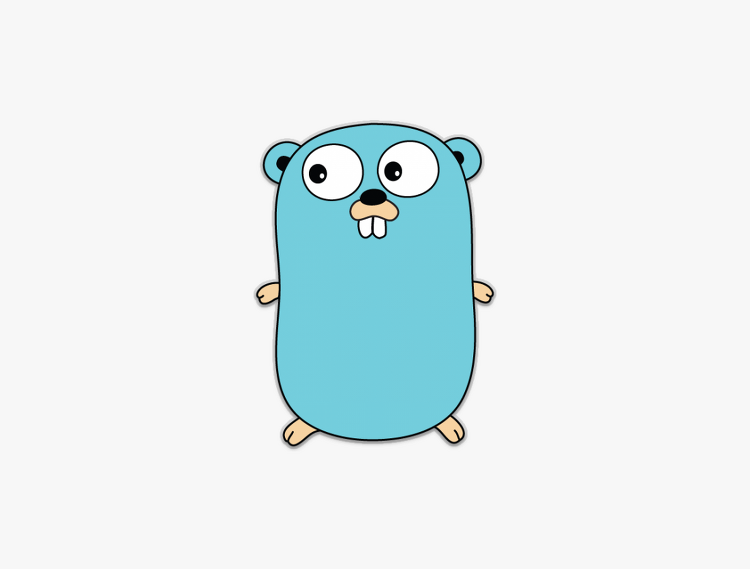AI 기반 시맨틱 통신이 이끄는 넥스트 통신 패러다임
섀넌의 법칙
오늘날의 통신은 섀넌의 법칙(Shannon's Law)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통신의 한계를 구하는 이론이며, 후술할 수식의 채널 용량 최대치를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와 같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섀넌의 이론에 기반하여 더 높은 채널 용량을 지니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섀넌의 법칙은 채널 용량을 계산하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author: yoonhyunwoo
이들은 각각 채널 용량(Channel Capacity), 대역폭(Bandwidth) , 신호 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 를 의미합니다. 알기 쉽게 말로 풀어내보면 최대 통신 속도(C) 는,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주파수 자원의 총량(B)에, 신호 품질(S/N)에 따라 그 자원 1Hz당 몇 비트의 정보를 실어 나를 수 있는지에 대한 효율(log₂(1 + S/N)) 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널 용량을 계산하는 법칙이 등장하고, 통신 업계는 채널 용량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략 70여 년간 통신의 혁신은 대부분 채널 용량의 개선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시대에 이르러서 프로세싱의 리소스는 너무나 발전했습니다. 통신은 텍스트를 보내던 시절에서 이제 공간 벡터를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쪼개서 전송하기엔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하루에도 수 테라에 달할 수 있으며, 이를 현재의 통신망으로 버텨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선을 포설하고 더 많은 안테나를 두며 해결하기엔 경제적/물리적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전체 비트를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통신간의 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컨텍스트의 전송만을 꾀하는 패러다임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념 자체는 수십년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지능 모델의 강력한 발전과 더 거대한 데이터의 통신이 필요해짐의 따른 변화입니다.
이것은 의미(意味)를 주고받는 통신이라고 하여 Semantic Communication으로 불립니다.
시맨틱 통신(Semantic communication)
시맨틱 통신은 기존에 데이터 전체를 전송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담긴 핵심 의미, 즉 맥락만 전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섀넌과 위버의 통신모델에서 제기된 문제이며, 그들은 통신의 성숙도를 세개의 레벨로 분리했습니다.
- 기술적 문제: 심벌(Symbol)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 이론의 핵심 영역입니다.)
- 의미론적 문제: 전송된 심벌은 원하는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 효과성 문제: 전달된 의미는 수신자의 행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까지 통신의 발전은 기술적 문제를 거의 해결하였고, 이젠 의미론적, 효과성 문제를 번역하는 과업을 수행합니다.
성숙도 1단계와, 2,3단계(시멘틱 통신)에서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불타는 집 예시가 쓰입니다.
어떤 집이 불타고있습니다.
현재의 통신 패러다임에서는 이 장면을 한땀한땀 데이터화하고, 이를 사진으로 전송합니다.
시멘틱 통신에서는 이를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불꽃이 보인다"처럼 모든 데이터를 보내는 대신, "화재 발생, 즉시 출동 필요"라는 핵심 '의미'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히 생략하고, 수신자가 특정 행동(출동)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소방이라는 카테고리의 동일한 지식 베이스를 지니고 있는 종단간의 통신이라면 이는 사태 파악에 필요한 전송 데이터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멘틱 통신의 핵심 인코딩/디코딩 로직은 통신 패러다임이지만 응용 레이어 위에서 동작합니다. 송신 측에서는 시멘틱 인코더를 통해 주어진 데이터를 의미론적 데이터로 변환하고, 수신측에서는 시멘틱 디코더를 통해 이를 뒷단의 소스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합니다. 둘은 같은 지식베이스를 가지고있는 추론모델따위의 형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거대한 데이터 전송 없이도 그 시멘틱을 주고받는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기존의 통신 패러다임의 완성도 위에서 보장됩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심벌을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어야하고, 이러한 성숙도 레벨은 이미 달성된 상태입니다. 이젠 전송된 심벌이 정보의 시멘틱을 얼마나 잘 전달 및 해석하냐가 주요 과제로 자리잡았고,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론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체계는 기존의 구문적 통신체계와 달리 신뢰성(reliability) 를 AI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동일한 Knowledge Based를 지녔다고 해도 모델의 블랙박스 영역에서 다른 해석이 쏟아져나올 수 있습니다.
후기
6G(6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이러한 시멘틱 통신이 적용되어 지능형 인터넷 체계가 될거라고 하는데, 응용계층 위에서 동작하는 패러다임이 왜 이동통신사의 연구과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저의 직관에서는 이통사에서는 기술적으로 심벌과 비트가 정확하게 전송되는 1단계의 성숙도 레벨을 보장하는 역할이고, 의미론적 통신이 동작하는 시점은 이미 응용 프로그램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신뢰성을 기본가치로 깔고가야하는 통신기술에서 이것이 신규 패러다임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또한 존재합니다. 저도 역시 이러한 의문을 품고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글을 쓰게되는 이유는 이동통신의 넥스트 패러다임이 꽤나 흥미로운 형태로 전개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널 용량의 확장을 위한 위성인터넷 도입이야 Project Kuiper, Starlink등의 등장으로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있는 사실이고 섀넌의 법칙에 구애받던 한계를 새로운 형태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꽤나 신기했습니다.
GO에 대한 내용이 없어 gopher로 마무리합니다.